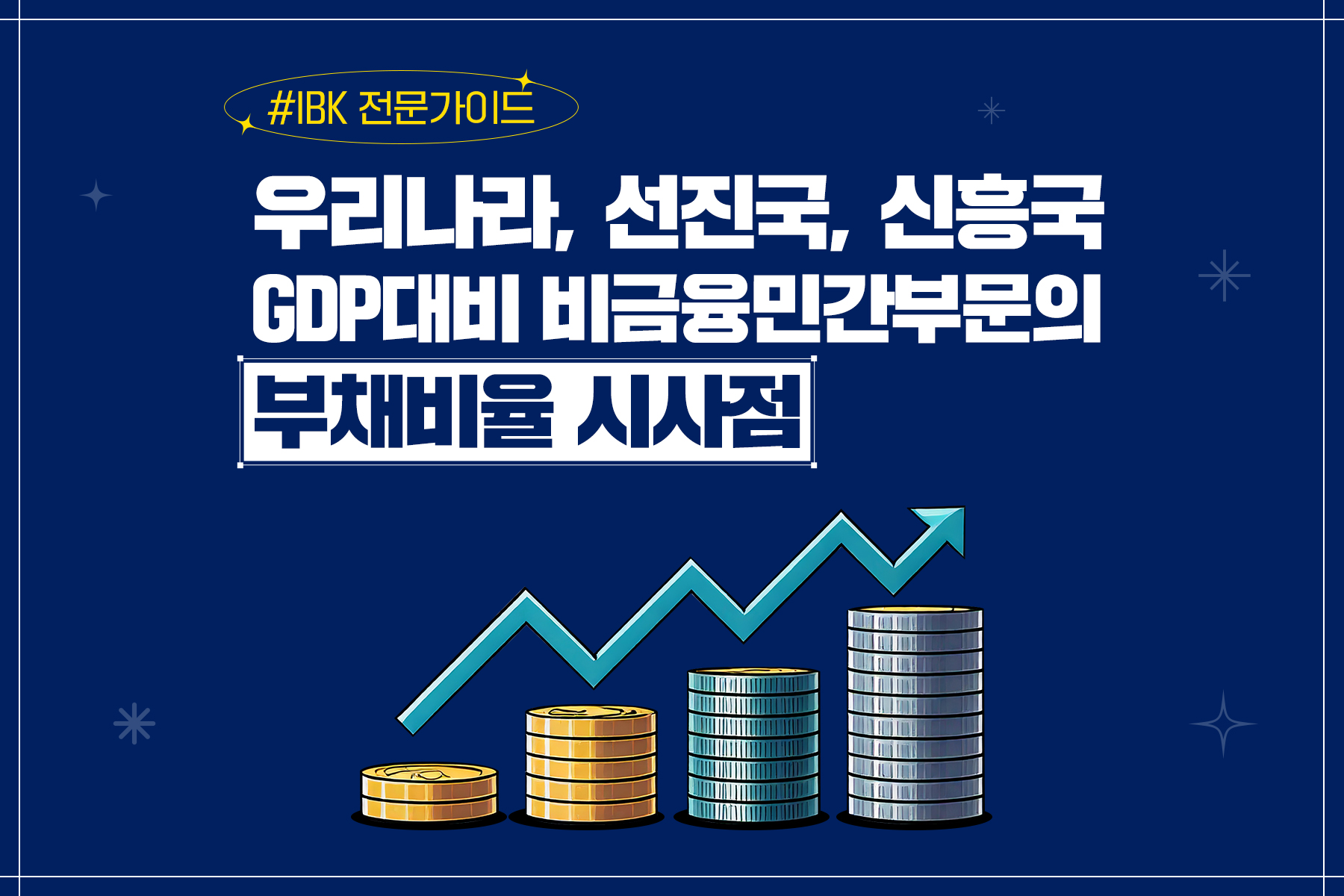

신흥국보다 선진국의 부채비율이 높은 것은 금융발전에 따른 현상

2000년-2024년 기간 동안 우리나라, 선진국, 신흥국 GDP대비 비금융민간부문(비금융기업과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부채비율을 보여주는 데 관련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반영한다. 우선 신흥국보다 높은 선진국의 부채비율은 금융발전에 따라 활성화된 자금중개가 성장을 촉진한 결과물이다.
한편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이 비율의 역수, 즉 빚 대비 GDP가 하락해 GDP보다 빚의 증가율이 커 빚의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시사한다. 빚이 지출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하지만 동시에 상환압력도 높아짐에 따라 지출을 줄이는 효과도 일어나기 때문이다. 부채비율이 일정 임계치를 초과하면 오히려 빚이 성장을 옥죄는 부채 오버행(Debt overhang)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빚과 성장 사이에 역 U자형의 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글로벌금융위기(GFC) 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선진국과 달리 신흥국과 유사하게 빚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글로벌금융위기(GFC) 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신흥국과 유사하게 빚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빚의 대국이 되었다. 비금융기업은 GFC를 겪으면서, 가계는 2010년대 중반부터 선진국을 추월했다.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채 빚에 의존한 성장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GDP가 빚의 증가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한국경제 저성장에 비롯
포스트 팬데믹에 들어서 민간부채비율이 날카롭게 조정되는 선진국과 신흥국과 달리 완만하지만 오히려 늘어나는 모습이다. 그 이유는 분모인 GDP가 빚의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21세기초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모든 유형(선진국, 신흥국 등)의 국가군보다 높았으나 불과 20년 만에 모든 유형의 국가군에게 밀린 결과다.

저성장은 통화당국의 기준금리인상 러시가 빚에 의존한 경제활동을 위축한데 상당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
포스트 코비드에서 일어난 저성장은 통화당국의 미 연준을 추종한 기준금리인상 러시가 빚에 의존한 경제활동을 위축한데 상당한 요인이 있으며 과다한 빚이 한국경제의 탄력성을 떨어뜨린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빚이 경제성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때 한국경제의 탄력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 존재
한국경제 탄력성이 떨어진 것은 기준금리가 금융중립 실질금리(R**)를 지나쳤기 때문이다. R**는 빚이 과다할 때 경제가 안정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시프트가 일어나게 하는 임계치를 말한다. R**는 3년 전 미 연준 연구자들이 GFC를 계기로 주류경제학의 반열에 오른 故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불안정가설을 실제 데이터로부터 검증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이들은 완전고용과 물가안정을 이루는 실물중립 실질금리인 R*와 달리 R**는 불안정하다고 밝혔다. 빚이 많은 경제에서 R**는 R*보다 낮을 수 있다. 즉 물가안정에 도달하기 이전에 금융불안정이 먼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물가압력이 높은 가운데 빚에 의존한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금융불안은 실물경제에 파급된다. 현재 한국경제의 실상을 말해주는 듯하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이자비용)이 1보다 낮은 취약기업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2023년 말 외부회계감사 대상기업 가운데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보다 낮은 한계기업의 비중은 26%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에서 빚은 경제탄력성을 회복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도전이다.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에 만성화된 좀비기업이 정상기업을 갉아먹는 좀비화가 핵심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컨센서스다. 빚과 성장 사이의 역 U자형 관계로부터 우리나라 가계 빚이 상위 소득분위에 집중된 현상은 빚의 부실화에 앞서 소비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실제로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지출비중은 OECD회원국 가운데 드물게 가계부채문제가 처음 대두되었던 2002년을 정점(56%)으로 50% 미만으로 줄어드는 장기추세를 보인다. 지난 20여 년간 소비가 성장을 끌어내린 것인데 이는 결코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2002년 말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60%가 넘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이미 당해연도에 소비가 성장을 촉진하는 임계치(IMF 추정치 36-70%)를 넘어섰기 때문일 수 있다.

앞으로도 빚이 경제성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면 한국경제의 탄력성은 더욱 약화되어 경화상태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 이때 통화당국은 기준금리를 내리기는 쉬어도 올리기는 더욱 어려워지며 부채 오버행은 심화되고 저성장은 고착화된다.

※ 본 콘텐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글로 금융·경제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IBK기업은행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인사이트 log'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저성장에 빠진 한국경제 (0) | 2025.06.26 |
|---|---|
| 외국인 투자자가 보기에 한국의 신용도는 어떤가? 무엇으로 판단하나? (0) | 2025.06.19 |
| 외환당국은 왜 국민연금과 외환스왑을 하는가? (0) | 2025.05.15 |
| 2기 트럼프 정부의 경제정책 (Trumponomics): 그 허와 실 (1) | 2025.04.24 |
| 내외 금리 역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채권을 매입하는 이유 (0) | 2025.04.17 |





댓글